메인 메뉴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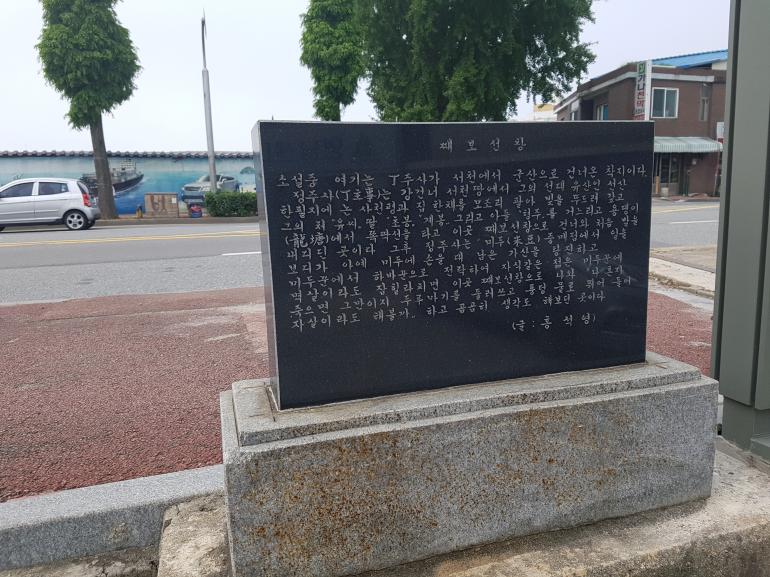
『채명룡 기자의 '걸어서 걸어서’-이야기가 있는 소설 탁류길』(15)
<시멘트 길, 길 위의 인생들>
시간이 게으르게 내려앉은 ‘탁류길’, 그 길 위의 인생들이 드문드문 펼쳐진 외롭고 고단한 표정이다. 고개를 내밀고 찬찬히 살펴보자면, 실개천을 따라 이 선창까지 흘러왔던 그 물길은 지금도 내항과 연결하는 수문을 거쳐 하구로 흘러든다. 아귀 같았던 입담은 지하로 흐르든지 아니면 물길을 따르든지 전설로 남았다는 걸 발견한다.
탁류의 군상들을 금강이 쓸어 담아 줄 것을 작가 채만식이 바랐듯이 이 선창은 낡아서 아스라한 추억을 사람들 가슴에 남겨 줄 것이다. 지난 세월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산다는 건 어려운 선택. 그러나 선창은 그 험한 날들을 온 몸으로 견뎌왔다.

서천 용댕이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 온 소설 탁류 속의 주인공 정주사가 험한 세파 속에서 시달리듯이 군산은 험한 질곡의 역사를 건너왔다. 일제 강점기 시장과 공설운동장이 자리 잡았던 철길 옆으로 이어졌던 개천은 복개되어 굽이굽이 길로 이어졌다.
시장 옆의 노점들이 좌판을 벌였던 자리에 새로 시장건물이 들어섰고, 세월을 비껴 선 상인들이 잡화점이며, 푸성귀며, 해산물 좌판을 벌여 놓았다.
한 켠에 서민들의 참새 방앗간인 ‘홍집’이 자리 잡았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 집의 정취는 그대로였다. 주인네 손등은 주름이 지고 단골로 찾던 이들의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선술집의 정서가 어디 가랴. 소맥 몇 잔에 얼굴이 벌게지지만 나는 이 문턱을 넘으면서 벌써 취기가 돌았다.
여기에서 만원 한 장이면 술 두병에 안주가 공짜이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나마 술값이 뛰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 만원에 3병, 그 후부터는 한 병에 3천원이었다. 쓰러져가는 병 숫자에 따라 안주의 가짓수도 늘어가는 선술집의 아리랑이 이어지던 곳이다. 그런 아련한 추억을 뒤로하고 시장통을 걷는다.

샛길로 난 죽성동 시장을 돌아 나갔다. 낮은 지붕과 닫힌 가게 문들이 이곳에선 세월이 더욱 더디게 흘러갔음을 속삭이는 듯 했다. 사람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허리 마디가 굳고 연골이 닳아져 멀쩡한 키도 쪼그라든다는 게 이해되는 골목이다. 그 낮은 지붕 위로 저녁 나절의 잔바람이 스산하게 내려앉는다.
이런 길 위에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변신시키며 살아남았다. 지난 시절의 잡화점과 생선가게들로 넘쳐났던 샛길 시장에는 김치를 답가주고 반찬을 해주는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장사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름의 색깔로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게 눈에 아련하다.

그렇다. 이 길이 시간의 흐름 속에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듯이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겉보기야 드러난 상처와 같아서 선뜻 손길이 닿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가는 가슴에 새겨진 흔적이랄까, 골목은 항상 변화 가운데 긴 흐름이 자리 잡아서 좋다. 아끼고 지켜주는 우리네 일상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저물 무렵이다.(1부 끝)
채명룡 / 2018.11.20 17:4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