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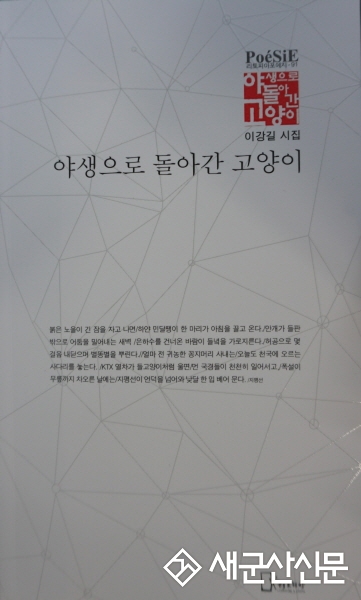
- 정직하고 따뜻한 시선을 담은 작품세계
- 75편의 ‘시다운 시’로 독자들 만나
이강길 시인과의 만남은 10여년이 조금 넘는데 전북작가회의에서였다. LH공사 전북본부에서 일한다고 했다. 첫 인상은 ‘조심스런 사람’이었다.
먼발치서 작가로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하고 자신의 말을 품 안에 갈무리할 줄 아는 신사였다.
어쩌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그의 첫 시집이다. ‘야생으로 돌아간 고양이’(리토피아)의 책 속에 “지금도 군산을 지키고 있느냐”는 짤막한 안부 쪽지도 곁들였다.
시집을 여는 순간 그의 성정답게 ‘아주 기본기에 충실한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그의 작품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시인입네 하면서 언어의 유희에 끌리지 않고’ 치열하게 그처럼 진력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동시대를 살면서 저렇게 우직하게 시적 정서와 시적 형상화를 위해 뚜벅뚜벅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첫 시집에는 75편이 담아져 있다. 무척 많은 분량이다. 도처에 깔린 그의 정직하고 둔중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지평선
붉은 노을이 긴 잠을 자고 나면
하얀 민달팽이 한 마리가 아침을 끌고 온다.
안개가 들판 밖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새벽
은하수를 건너온 바람이 들녘을 가로지른다.
허공으로 몇 걸음 내딛으며 별똥별을 뿌린다.
얼마 전 귀농한 꽁지머리 사내는
오늘도 천국에 오르는 사다리를 놓는다.
KTX 열차가 들고양이처럼 울면
먼 국경들이 천천히 일어서고,
폭설이 무릎까지 차오른 날에는
지평선이 언덕을 넘어와 낮달 한 입 베어 문다
“개나리가 슬며시 담장을 넘고, 겨울 동안의 권태와 고요가 나뭇가지 끝에서 깨어나고, 붉은 노을이 긴 잠을 자고, 때 아닌 대설주의보로 대로변이 소란스럽고, 한 남자가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굽고, 자동차 앞 유리창에서 즉석무대가 열리고, 햇살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머리맡 핸드폰이 간간이 뒤척이고, 연말연시 나무들이 결박당하고, 여자가 반려견에 볼을 비비고, 어둠이 정지선에 붙잡히고, 초침이 침묵을 깨고 퍼득이고, 시위 현장에서 취루탄을 맞고, 어둠이 노을의 끝을 덥썩 물고, 애 안 낳는 시대에 왜 그리 많냐고, 분홍 스웨터에 파랑 몸빼 입고.....” 등등등 그의 시적 열망은 이런 이미지이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이면서도 싫증나지 않는 게 참 이상하다. 시집을 읽는 내동, 그게 이강길 시인 아닐까 생각했다. 아껴두고 찬찬이 읽어보아야겠다.
임실 출신인 그는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재직하고 있다. 2010년 <문학광장> 신인문학상을 받아 등단했다. 전북작가회의, 지평선시동인 회원.
채명룡 / 2019.12.18 15:33:39












